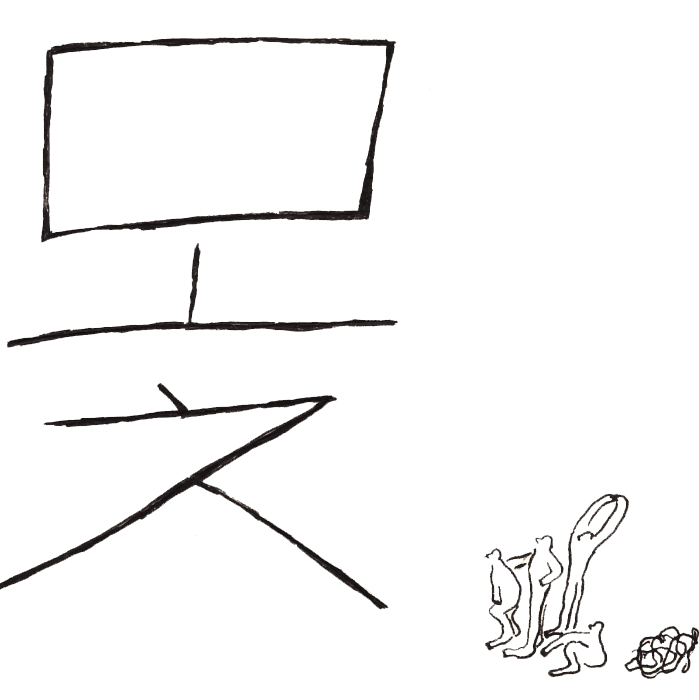10화. 낮아진 문턱에서 탄생한 만남들 – 재난의 시대를 맞이한 우리들의 춤
2020년 봄. 가을쯤 프랑스를 방문해 짧은 공연을 시연하고, 관련 주제의 무용가들을 만나는 교류프로젝트를 계획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 사업에 지원했고, 2차 인터뷰 심사에서 코로나로 직접 교류가 어려워질 경우, 온라인으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를 심사위원들이 물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모르고 당시의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가 올해의 현실이 되고 말았다.
프랑스 현지 사정은 한국보다 좋지 않았다. 일일 확진자수가 3~4만 명을 웃돌자 10월 말 프랑스 정부는 이동제한령을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우리는 10월로 계획한 방문 일정을 11월, 그 다음해 1월로 계속 변경하며 어떻게든 가보려고 했다. 결국 레지던시를 진행하기로 한 무용센터에서 당분간 외국에서 입국한 극단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우리는 그렇게 ‘설마의 시나리오’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쪽 문턱이 높아지자, 다른 문턱이 사라졌다. 온라인 속 공간에선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만 서로 준비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재난 속에서, 만나려고 한 예술가들은 우리의 변화된 계획을 충분히 공감했다. 우리 팀과 해당 예술가 이렇게 좁게 설정했던 교류범위 또한 확 넓어졌다. 관심 있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만남이 됐다. 직접 우리가 그 곳에 갈 수 있었다면, 온 몸으로 부딪치며 새로운 자극들을 받고, 계획하지 못한 우연한 만남들로 이 여행이 얼마나 풍요로워 졌을까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았다. 현재 불가능한 꿈은 잠깐 옆에 두고, 미래에 더 진-하게 만날 수 있는 사전 단계로 이 프로젝트는 차츰 발전해갔다.
프로젝트 이름은 원래 시연하려고 했던 작품 ‘데게베(Degesbe)’의 이름을 따 붙였다. ‘무엇을 찾고 있는가? 거기엔 아무 것도 없다’라는 뜻의 이 제목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양한 감상을 불러 일으켰다. 내게는 서로 다른 것을 구분 짓는 행위 속에서 우리가 놓쳐버리는 건 무엇일까, 서로의 차이를 마주하고 만나고자 할 때의 태도에 대한 질문으로 다가왔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회가 됐지만, 차이점이 어떤 맥락에서는 차별의 이유로 여전히 둔갑하곤 한다. 이 프로젝트로 우리가 더 폭넓은 시야를 갖고 나눌 수 있길 바랐다.?
‘춤, 경계를 넓히는 용기와 자유’라는 주제 아래 2월 3~4째주 동안 두 번의 아티스트 토크, 그리고 디지털 쇼케이스가 진행되었다. 한국의 관객들과 함께하는 이 대화엔 프랑스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국제적인 무용가 메를랭 니야캄(Merlin Nyakam)과 살리아 사누(Salia Sanou)를 초대했다. 아프리카권의 현대무용에 대한 정보나 공연 등이 극히 드문 한국에 이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따따지 온라인 극장 플랫폼을 통해, ‘데게베 2 – Looking back (처음으로부터)’란 쿨레칸 팀의 20여 분간의 공연이 열흘 동안 발표됐다. 기존 작품에 새로운 관점을 더한 내용으로, 댄서들은 각자의 춤의 ‘뿌리’와 발전해온 과정, 새로운 만남에 대한 그간의 경험들을 몸으로 회상하고 그려냈다.
‘아티스트 토크’ 프로그램은 내가 좀 더 중심이 되어 준비했다. 사실 지난 가을 파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을 때부터 나는 흥분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백하자면 나는 그들의 오랜 팬이라, ‘성공한 덕후’가 된 셈이다. 쿨레칸 일을 시작한 2014년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동료 엠마누엘로부터 듣고, 책과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만나며 ‘언젠가 한번은 꼭 만나고 싶다’고 마음 한 켠에 꿈을 품어왔다. 1월 말, 사전 인터뷰 일정을 잡고 질문지를 구성하며 나는 꿈속에서도 질문을 외치는 상태가 됐다.
묻고 싶었던 건, 자신의 전통을 바탕으로 창작하는 예술가가 다른 문화권으로 이주하면서 어떤 인식을 만났고, 그리고 그 경험이 작품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 상황 속에서 주체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90년대부터 프랑스에서 활동한 두 안무가는 프랑스 샤이요 국립극장, 몽쁠리에 당스 축제 등 ‘권위 높은’ 극장들과 작품을 공동제작하며, 현재까지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오고 있다. 나의 기준에서 ‘성공한 예술가, 더군다나 이주예술가’였고,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원래는 ‘아프리카 안무가들’이란 이름으로 기획한 프로그램 제목을 사전 인터뷰를 하고 나서 지워버렸다. 2016년부터 한국에 방문한 아프리카권 무용가들의 댄스워크숍을 열어오며 만든 이름이었다. 문득 이들을 한국에 ‘잘’ 소개하기 위해 인터뷰를 하는데, 내 질문이 함축하고 있는 편견이 느껴졌다. ’왜 메를랭은 ‘원시’에 대한 작품을 만들었을까?’ 생각하며 나는 당연히 그가 ‘아프리카인’이기 때문에 프랑스 사회에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 생각했다. 왜냐면 나또한 한국에서 일할 때, ‘아프리카=원시적(primitive)’이란 편견을 학교와 극장에서 곧잘 마주치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내 예상과 달랐고, 답변을 들으며 내 질문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아프리카 안무가’는 그의 정체성의 일부이지만, 그의 세계를 온전히 설명하기엔 참 부족한 말이었다. 이들과의 이야기는 나의 인식을 한 차원 넓혀주는 감사한 기회가 되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몿진의 인터뷰와 이후 자료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
각 대화마다 약 15명의 참여자들이 신청했다. 안무가의 유년시절과 문화에 대한 소개, 이주하게 된 과정, 그리고 대표적인 작품, 현재 코로나로 변화된 춤과 일상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눴다. 참여자들은 창작자의 태도와 발전과정, 전통춤과 현대무용에 대한 생각, 외국인이 아프리카 춤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에 대한 생각 등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지며, 대화는 더욱 풍부해졌다. 대화가 끝나고, 메시지와 이메일로 피드백을 남겨주신 참여자분들께 한 번 더 감사드린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기능적으로는 가능했던 만남이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재난적 상황을 어떻게든 돌파하고 적응하고자 하는 모두의 동기가 새로운 만남을 열었다. 코로나를 겪으며 살리아 사누는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현재 활동도 줄어든 젊은 아프리카의 무용가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써클(Le Cercle / R?seau International des Chor?graphes Afrique et Diaspora)’이란 커뮤니티를 2020년 만들었다. 아프리카 대륙의 무용가들과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무용가들이 함께 각자의 프로젝트와 정보를 공유하고, 젊은 무용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연대의 모임이다.
매달 1회씩 줌을 통한 만남이 기획되는데, 지난달 2월 26일엔 ‘100% 여성 안무가’란 주제로 열렸다. 모두가 ‘마망(Maman)’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하는 세네갈의 제르멘 아코니, 토고의 플로라 테파인 안무가를 인터뷰하고, 짐바브웨와 베넹, 마다가스카르와 남아공의 무용가들이 현재 자신의 상황을 나누고, 짧은 공연영상을 함께 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영어와 프랑스어로 진행되고,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시작해 집중력을 끝까지 갖기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작업관과 현재 작업을 공유하고, 응원과 지지, 조언의 피드백들을 나누며 점점 싹트고 커져가는 힘들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기존의 만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아예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커뮤니티가 시작된 것이 아닐까. 여전히 희망은 열려 있다는 살리아 사누의 말을 오늘도 되새겨본다.
글 | 소영